〈태일루의 시선〉 다시 고개 드는 원전 담론, 실용이 아니라 정치의 언어

본문
최근 주요 보도에서 원전이 다시 ‘합리’와 ‘안정’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에너지 수급과 산업 경쟁력의 문제를 다루는 기사이지만 그 안에는 정치와 산업, 언론의 이해가 얽힌 복합적 움직임이 숨어 있다. 보도는 재생 에너지의 불안정성을 강조하며 원전을 국가의 경쟁력과 기술 자존심의 언어로 포장한다. 이 흐름은 단순한 산업 논의가 아니라 한 사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조립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 정치적 복원 서사가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 에너지 정책 연구자는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국정 기조로 내세운 이후 원전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 정권의 상징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원전 담론은 기술 논의보다 ‘정상 국가의 회복’이라는 정치적 언어로 소비되고 있으며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논란은 정권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수단처럼 쓰이고 있다. 원전은 기술이 아닌 정치의 은유가 된 셈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산업계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불안을 곧바로 탈원전 정책의 실패로 연결하는 건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정책의 흔들림은 행정의 문제이지 기술 체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치적 불만의 형태로 포장하며 ‘탈원전 → 산업위기 → 원전 복귀’라는 단순한 서사를 반복하고 있다.
에너지 담론의 지형 변화에는 사회적 피로감도 작용한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각종 비리와 화재 사고 등으로 정치화되면서 시민들은 신재생 에너지의 이상보다 현실적 대안을 원전에서 찾게 됐다. 전문가들은 “신재생 담론의 정치화가 원전의 재등장을 자극했다”고 평가한다. 정책 실패의 일부를 산업 전체의 무능으로 일반화한 결과, 재생 에너지는 기술이 아닌 이념의 이름으로 소환되고 있다.
언론 구조의 경제적 요인도 이 흐름을 뒷받침한다. 한 미디어경제학 교수는 “에너지 공기업이 여전히 주요 광고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에너지 이슈를 독립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 원전 산업의 홍보 예산이 증가할수록 지면의 논조는 ‘기술 중심’ ‘국가 산업’ 프레임으로 기울었다. 결국 원전은 ‘산업의 자존심’, 신재생은 ‘정책의 실패’로 대조되며 보도의 방향은 시장의 논리가 아닌 생존의 논리에 좌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의 근거는 취약하다. ‘탈원전이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라는 단정은 국제 연료비 상승과 전력시장 구조의 복잡성을 무시한 단선적 해석이며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도 노후 설비와 폐기물 처리 문제를 외면한다. 전문가들은 “원전의 효율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과학이 아닌 정치의 언어로 다뤄질 때 정책은 방향을 잃는다”고 경고한다. 결국 이 담론은 합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진영 논리의 재포장에 가깝다.
정치가 만든 담론의 그림자는 현장에 드리워진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언론의 공격 속에서 도덕적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조금 의존 구조로 오해받고 일부 비리 사례가 산업 전체의 낙인으로 확대된다. 정책의 불안과 금융 규제, 전력 거래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이들은 묵묵히 전력을 생산하지만, 언론의 조명은 늘 그 반대편에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치가 에너지를 논할 때마다 현장은 침묵을 강요받는다”고 말했다. 보도의 방향이 원전을 향할수록, 재생에너지는 불신의 언어로 밀려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을 정치의 도구로 쓰지 않는 합리적 사고다. 에너지 전환의 논쟁은 가능해야 하지만, 그것이 진영으로 굳어질 때 산업은 멈춘다. 원전은 과학이고 태양광은 감성이라는 단순한 구도는 결국 국가의 미래를 감정의 언어로 설계하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 정책의 균형이 무너질수록 멍드는 것은 언제나 재생 에너지의 현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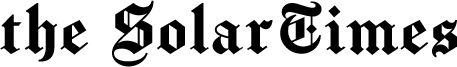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