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루의 시선] 전기요금 인하론의 착각, 문제는 발전이 아니라 계통이다

본문
전기요금 인하 논의는 늘 연료비에서 출발한다. 국제 가스 가격이 내려가면 전기요금도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주요국 전기요금 구조를 보면 이 기대는 반복적으로 빗나간다. 발전·판매 비용은 조정될 수 있지만, 송전·배전과 정책 비용은 구조적으로 늘어난다. 전기요금의 방향을 결정하는 축은 이미 연료에서 계통으로 이동했다.
해외 주요국의 전기요금 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토 면적과 무관하게 송전·배전 비용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전체 전기요금의 약 30~40%가 송전·배전 비용으로 추정된다. 장거리 송전, 노후 인프라 교체,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계통 보강 비용이 요금에 직접 반영된 결과다. 반면 국토 면적이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 역시 송전·배전 비용 비중이 대체로 25~30% 수준에 이른다. 이는 면적이 아니라 전력 시스템 구조의 문제다.
유럽 국가들의 공통점은 전력망을 단일 국가 인프라가 아니라 통합 계통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국가 간 연계망, 해저 케이블, 고압직류 송전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고 그 유지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이 흐름을 더 가속했다. 전력 흐름은 단방향에서 다방향으로 바뀌었고, 피크 대응을 위한 여유 설비가 늘어났다. 실제 이용률이 낮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망이 증가했고, 그 비용은 숨기지 않고 요금으로 회수됐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전기요금 구조는 국제적으로 예외에 가깝다. 한국의 송전·배전 비용 비중은 약 10~15%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전력망 투자가 적어서라기보다, 그동안 망 비용을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한전 재무 구조나 정책 판단으로 흡수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낮은 발전비 덕분이 아니라, 아직 청구되지 않은 계통 비용 위에 유지돼 온 구조였다.
종합하면 전기 요금의 상방 압력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발전·판매 부문은 연료비를 안정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송전·배전과 정책 비용은 구조적으로 증가한다.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연계, 계통 안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로 전환됐다. 이 비용을 외면한 채 전기요금 인하만 요구하는 접근은 현실성이 없다.
문제는 이 비용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다. 이 산업들은 값싼 전기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력을 요구한다. 망 투자와 계통 보강을 미루면 전기 요금은 일시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력 부족과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결국 투자지는 해외로 이동한다.
탄소 중립 역시 선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전력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느냐의 문제다. 태양광과 풍력은 단독으로는 불완전하지만, 계통과 결합될 때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전원이 된다. 여기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하면 재생 에너지는 변동성 리스크가 아니라 계통 안정 자산으로 전환된다. 이는 전기 요금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송전·배전 비용 상승 속도를 늦추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결국 선택지는 분명하다. 망 투자와 재생에너지, ESS를 통한 구조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느냐, 아니면 요금 억제로 시간을 벌다 더 큰 비용을 떠안느냐의 문제다. 전기요금 논쟁의 초점은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AI 경쟁력과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가장 낮은 총비용으로 달성하는 경로가 무엇이냐로 옮겨가야 한다. 전기요금은 정쟁이 아니라 전기 요금 구성의 논리에 입각해 검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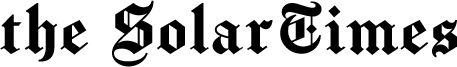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