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루의 시선] 액션 플랜 없는 예산 증액은 공허하다

본문
정부는 내년도 재생에너지 예산을 전년 대비 42% 늘렸다. 1조2천억 원이 넘는 지원 규모는 숫자만 놓고 보면 분명한 의지다. 더 많은 태양광과 풍력, 더 빠른 전환, 더 큰 전기 시스템을 예고하는 듯하다. 그러나 현장은 묻는다. “그 돈,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예산은 위에서 만들어지지만 전기는 아래에서 생산된다. 어딘가에서 이 둘은 만나지 못한 채 어긋나 있다.
예산은 전력망을 움직이기보다 문서와 계획 속에 머무른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지만, 송전망은 이미 포화됐고 배전선은 주민 갈등으로 묶여 있다.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태양광 발전소만 수백 메가와트다. 설치는 끝났는데 전기를 못 흘린다. 정부의 예산은 설비를 늘리는 데 집중돼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연결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이다. 그 길을 깔아주는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예산 확대가 “산업 생태계의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균열이 시작된다. 특히 100kW, 500kW 규모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예산이 늘었다는 뉴스를 보면서도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REC 가격은 호황기였던 2017년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SMP가 올라도 변동비 정산제로 수익은 제한되고, 은행 문턱은 높아졌다. 정책자금 대출은 서류 더미만 남기고 금융은 “지원”이 아니라 “심사 강화”에 가까워졌다.
설비는 있는데 전기를 못 보내는 상황도 반복된다. 접속 승인만 기다리며 세금, 보험료, 유지비를 떠안는다. 송전선로 증설 계획은 있지만 ‘어디부터, 언제까지, 누구 책임으로’라는 설명은 없다.
현장의 말은 단순하다.
“예산은 계통보다 앞서가고, 정책은 현금흐름보다 앞서간다.”
정부는 수소, AI, 스마트그리드를 이야기하지만, 작은 발전소 운영자는 묻는다.
“우리는 당장 다음 달 유지보수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예산 집행 구조도 문제다. 예산은 주로 금융지원, 보급지원, 기술 개발에 묶여 있다. 그러나 이 구조는 민간 설치업자와 사업주가 겪는 운영 리스크—REC 변동성, 계통대기, 금리 부담—를 해결하지 못한다. 기술개발 예산은 늘지만, 정작 산업단지 가장자리에 있는 200kW급 발전소는 인버터 교체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말하지만, 현장은 ‘유동성’을 먼저 이야기한다. 이 간극은 숫자보다 냉정하고, 말보다 현실적이다.
결국 지금 필요한 질문은 방향이 아니라 방법이다. 예산은 방향을 정했지만, 현장은 실행 계획을 묻고 있다. 구체적인 행동의 언어가 필요하다. 송배전망 확충을 누가, 어떤 재정 구조로, 몇 년 안에 수행할 것인지. 접속 지연 문제를 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지. REC 가격 하한이나 수익 안정장치는 포함돼 있는지. 소규모 사업자도 접근 가능한 금융 모델은 설계되어 있는지.
정부는 ‘전환의 시대’를 말하지만, 산업은 ‘연결의 기술’을 요구한다. 예산은 이미 발표됐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서 무엇을 바꿀 것인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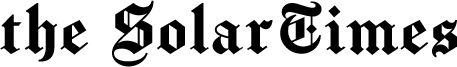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