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2부] 수사로 흔들리고, 중국에 잠식된 태양광… 윤석열 정부의 산업 전략은 없었다

본문
한국의 태양광 보급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누적 설치용량은 30GW를 넘었고, 전국 18만여 곳의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 중이다. 겉으로는‘그린 붐’이지만 산업의 심장은 식어가고 있다. 공장은 멈췄고 기술 인력은 떠났으며 국산 부품의 비중은 10%도 남지 않았다.
태양광이 성장할수록 산업은 쇠퇴하고 있다. 보급 통계는 늘었지만 시장의 이익은 중국으로 향한다. 한국의 태양광 산업은 설치 산업으로만 남았고 기술·제조·공급망은 무너졌다. 정책은 환경을 말했다가 곧 정치로 변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겼을까. 정부의 보급 중심 정책, 중국의 가격 공세, 그리고 정책 신뢰의 붕괴가 한 축을 이뤘다. “RE100”과 “탄소중립”이 세계의 공통어가 된 지금 한국은 기술 강국이면서도 산업의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다.
본지는 태양광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정책 전환 이후 산업 생태계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4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편집자 주).
윤석열 정부의 태양광 정책은 ‘관리’와 ‘정상화’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산업의 활력을 앗아간 결과로 귀결됐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비리와 이권 의혹이 있었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잇따라 진행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장 신뢰와 산업 기반이 동시에 흔들렸다. 산업계는 “정책보다 수사가 앞섰다”고 지적했고 현장에서는 “투자보다 불안이 커졌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를 제도 정비 과정이라 설명했지만 업계는 “검찰 논리로 경제를 운영했다”고 반박했다. 한 모듈 제조사 대표는 “정책 발표 한 번에 은행 대출이 중단되고, 발전사업자들이 계약을 취소했다”며 “정부보다 수사기관이 시장을 좌우했었다”고 말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 신규 투자는 멈췄고 2023년 이후 업계 기술인력 1,000여 명이 배터리·ESS·수소 산업으로 이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신규 설치용량은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책 기조를 옹호했지만, 업계에서는 “투명 대신 불신이 커졌다”는 냉소가 퍼졌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비리를 잡는다고 산업 전체를 없앨 수는 없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 격”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사 중심의 행정은 단기적으로 도덕성을 강조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산업 생태계의 복원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 와중에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했다.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셀, 모듈까지 모든 공정에서 중국 점유율은 80~95%에 이른다. 값싼 전기료와 대규모 보조금, 그리고 공정 간 통합 투자 구조를 기반으로 중국은 단가를 압도적으로 낮췄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태양광 공급망의 과도한 중국 집중이 에너지 안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 이후에도 세계 각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못했다.
중국의 주요 기업인 론지(LONGi), 진코(Jinko), JA솔라(JA Solar)는 연간 100GW 이상을 생산하며 사실상 시장의 가격 주도권을 독점했다. 셀 단가를 0.15달러/W 수준으로 유지한 중국산 제품은 국산 셀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다. 국내 산업은 상위 공정이 무너지며 경쟁 기반을 잃었고,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국내 셀 국산화율은 5% 미만에 머물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단가가 아니라 체계로 승부한다”며 “전 공정을 자국 내에서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완성하고, 금융 절차와 인허가를 단축해 자금 회전 속도까지 빠르다”고 분석했다.
그 사이 윤석열 정부는 “중국산 저가 공세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외국 의존을 비판했지만 정작 국내 기업을 보호하거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실질적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국산 모듈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구호만 되풀이했지만 정작 세제 혜택·금융지원·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 산업계에서는 “중국 탓만 하면서 정작 국내 공급망은 방치됐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현재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인버터의 90%, 모듈의 85%가 중국산이다. 일부 장비는 통신 및 원격제어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사이버 보안과 전력망 안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모 전문가는 “비리 단속은 필요했지만 산업의 미래를 설계할 청사진이 함께 제시됐어야 했다”며 “정부가 신뢰를 잃는 순간, 투자와 기술은 국경을 넘어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잃게 만든 것은 외부의 중국이 아니라 내부의 무능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았지만 실제 붕괴는 안에서 시작됐다. 수사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정책은 멈췄고 산업은 길을 잃었다. 진짜 위기는 중국산 모듈이 아니라 산업을 전략 없이 다룬 정권 그 자체였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정상화를 원했다면 불신이 아닌 신뢰로, 단속이 아닌 비전으로 산업을 이끌어야 했다. 지금의 태양광 산업은 ‘중국의 그림자’가 아니라 ‘정책의 빈자리’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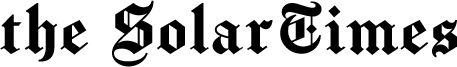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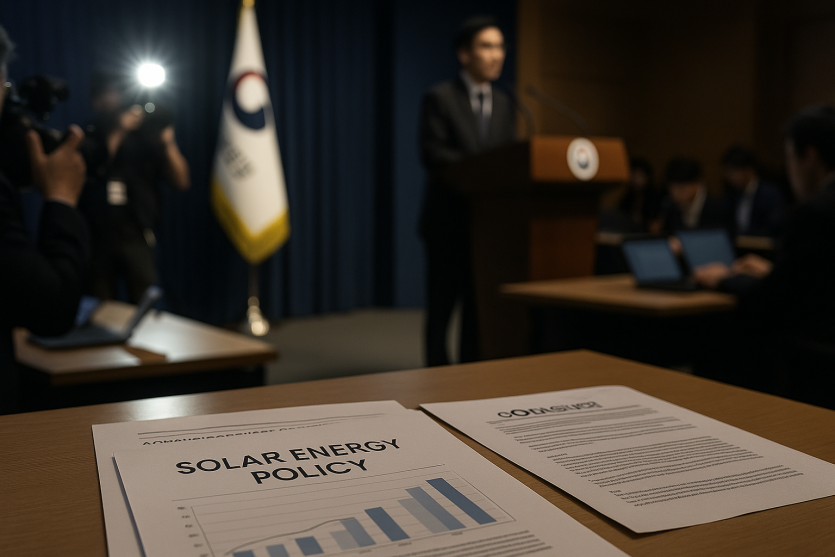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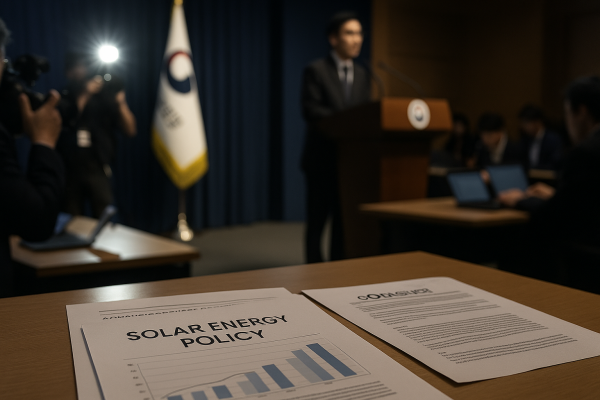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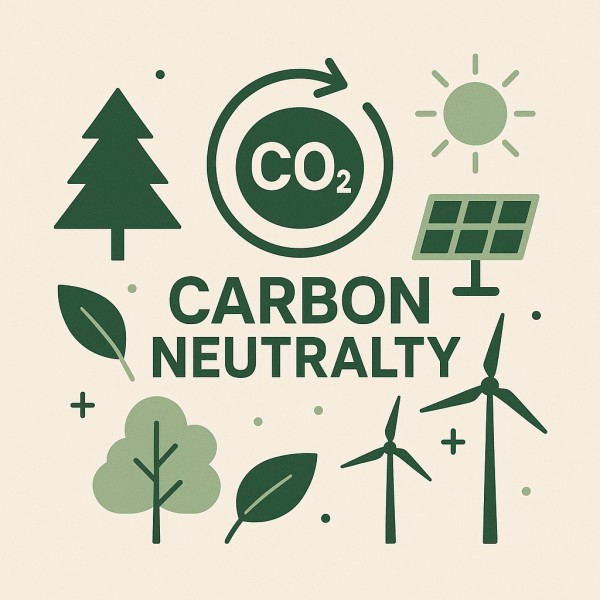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