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조 원을 태우는 석탄발전…이미 끝난 투자, 왜 국민이 계속 내줘야 하나

본문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석탄발전 과잉보상 실태와 해결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소 상당수가 이미 투자비와 적정 이윤을 모두 회수했음에도 초과보상을 받으며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가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와 전기요금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력시장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의 부채는 2024년 120조 원을 넘어섰고 이는 2020년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연료비 급등 시기에도 화력발전 연료비를 그대로 보전해 온 총괄원가보상제를 핵심 원인으로 꼽는다. 한전 자회사 발전소에 위험 없는 이윤을 보장하는 이 구조가 산업화 시기 도입된 뒤 기후위기 시대에도 유지되며 전력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3기 석탄발전기 중 36기는 이미 투자비와 적정이윤(WACC 4%)을 모두 회수한 상태였다. 이들이 남은 수명(약 30년)을 그대로 채울 경우 초과보상 규모는 5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 수익률을 6%로 상향해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40조 원이 넘는 초과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발전기는 장기 수익률이 13~16%에 달해 공적 재원에서 과도한 이익이 지급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용량요금 역시 왜곡의 한 축이다. 발전소가 실제 전력을 생산하지 않아도 ‘준비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이 제도는 지난 10년간 기준가격이 90%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발전기의 실제 고정비는 감소했음에도 보상은 확대돼 불필요한 비용이 누적되고 있다.
연료비 변동 위험이 발전사가 아니라 한전에 전가되는 구조도 문제로 지목된다. 국제 연료비가 급등하던 시기 발전자회사는 상승분을 그대로 보전받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한 반면 한전은 재정 부담을 떠안았다. 결국 국민이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비용을 부담하는 ‘보이지 않는 보조금’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미 투자비 회수를 마친 석탄발전기의 우선 퇴출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탈석탄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조기 퇴출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재생에너지, ESS, 가상발전소(VPP) 등 신규 전력자원에 재투자하면 전력시장 효율과 전환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전력시장 보상체계를 ‘비용 보전 중심’에서 ‘효율·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괄원가보상제 폐지, 한전·민간발전소 수익률 전수조사, 유연성 자원 보상 확대 등 근본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개편이 지연될 경우 공적 재원은 계속 석탄발전에 묶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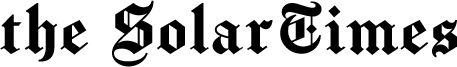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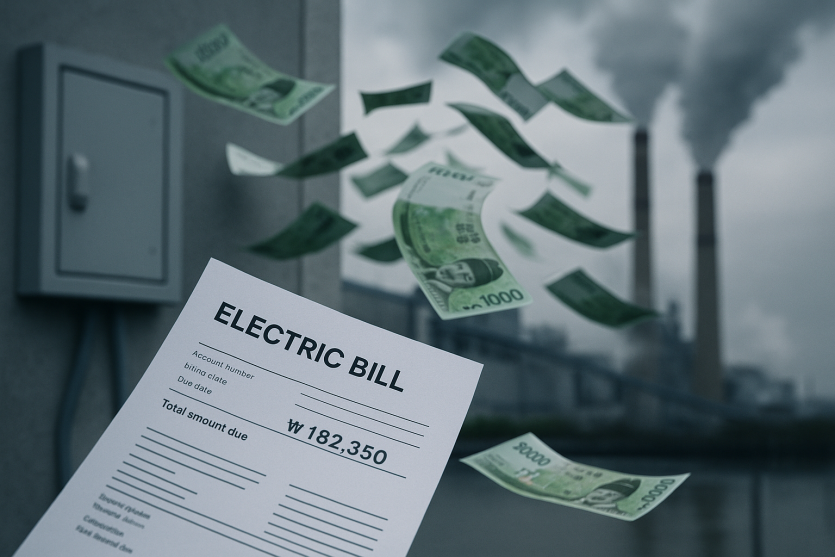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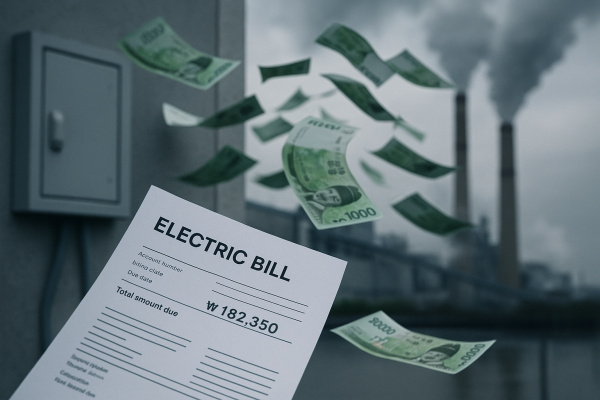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