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국산화, 정부·대기업·중소기업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본문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산화 정책을 본격 준비하면서 국내 태양광 산업이 재편의 기로에 섰다. 인버터·셀·모듈 등 핵심 장비의 중국 잠식이 수년째 지속된 가운데 정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이 동시에 ‘국산 공급망 복원’에 나서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태양광 시장 규모가 향후 연간 10GW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태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수십조 원 규모의 시장이 사실상 중국에 귀속될 것이란 위기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곳은 인버터 분야다. 국내 시장의 90% 이상을 중국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대기업들이 기존의 중국 직수입 방식을 줄이고 국내 중견·중소 인버터 공장에 위탁생산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몇몇 기업은 협상 단계에 들어갔고, 인버터 제조사들은 ‘산업협의체’를 구성해 국산화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역시 KS 인증 강화, 통신장비 관련 기준 상향 등 비관세장벽 형태의 ‘기술 기준 강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모듈과 셀 분야에서도 국산화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생산세액공제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집중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차세대 기술인 텐덤셀 조기 상용화를 위한 R&D 예산 확대도 논의 중이다. 실리콘 기반 기존 셀 대비 최대 1.6배 높은 효율을 내는 텐덤셀은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벗어날 수 있는 기술적 돌파구로 평가된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솔라타임즈가 기획기사에서 지적해온 시장 구조 문제와도 맞닿는다. 솔라타임즈는 그동안 국내 태양광 생태계가 △중국 가격 경쟁에 기반한 덤핑 구조 △대기업의 해외 제품 유통 중심 정책 △중소기업의 생산 기반 붕괴 △국내 제조업 기술유산 상실 등 복합적인 압력으로 사실상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고 분석해왔다. 특히 인버터·셀·모듈의 국산 점유율 하락은 단순 경쟁력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연간 태양광 설치 목표가 3GW에서 10GW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급망이 모두 중국산으로 채워질 경우, 한국 전력계통의 근간이 해외 기업 기술과 가격 정책에 사실상 종속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실제로 일부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이미 중국산 장비를 배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산 장비 사용을 의무화·우대하는 정책 패키지도 검토 중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 구조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기업은 수년간 비용 문제를 이유로 설비를 철수한 상황이지만, 국내 공장을 유지해온 중견·중소기업들은 국산화 전환의 핵심 파트너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생산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원가 절감을 요구하고 있어, 비용·품질·생산능력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튼튼한 동맹 구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내 태양광 산업은 오랫동안 중국산 가격 공세와 국산 장비 외면 구조 속에서 침체돼 왔다. 그러나 정부 정책 전환, 대기업 역할 변화, 기술 국산화 필요성 확대가 겹치며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번 국산화 드라이브가 단기 가격보다는 장기 산업 생태계를 중점에 둔 정책으로 자리잡는다면, 국내 태양광 생태계가 다시 한 번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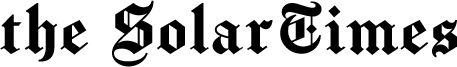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