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 리포트] 미국·중국·독일·일본… 세계 태양광 판도 속 한국의 선택

본문
세계 태양광 산업이 각국의 정책, 기술, 시장 상황에 따라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 이번 주 흐름만 봐도, 미국은 정책 축소로 수요 위축 경고가 나오고, 중국은 초고속 성장의 그늘에 공급 과잉이 드리운다. 독일은 성장세를 유지하지만 유럽 전체는 10년 만에 처음 역성장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은 차세대 기술과 제도 개편으로 장기 체질 개선에 나섰고, 한국은 입찰제 확대와 시장 다각화로 방어선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됐던 ‘Solar for All’ 프로그램을 연방 차원에서 중단하고, 주거용·상업용 태양광에 적용되던 세액공제와 일부 보조금 규모도 축소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 조치가 주거용 태양광 신규 설치 수요를 크게 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2025년 상반기 설치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2분기 들어 감소 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대표 주거용 설치업체인 선런(Sunrun)은 2분기 깜짝 흑자를 기록하며 주가가 32% 급등했다. 제조 설비 증설과 고정비 절감이 효과를 낸 사례지만, 산업 전반으로 보면 ‘제조 용량 증가·설치량 감소’라는 이중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태양광 공급망의 절대 강자다. 올해 1~5월 신규 설치 용량만 198GW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8% 폭증했다. 상반기 누적 설치 용량은 1,080GW를 돌파해 전년 대비 56.9% 증가했다. 올해 연간 설치 목표치인 380GW 달성이 무난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공급 속도가 수요를 크게 앞지르면서, 폴리실리콘과 모듈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중국 내 주요 제조기업들은 재고 압박으로 감산이나 생산라인 조정에 들어갔으며, 일부 기업은 지난해 인력의 30% 이상을 감축했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가격 폭락이 세계 시장 전체를 흔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독일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4.65GW의 신규 설비를 설치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4% 성장했다. 총 설치 용량은 약 99GW로,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의 60%를 넘겼다. 그러나 유럽 전체를 보면 상황이 다르다. EU 전역의 신규 설치 성장률이 –1.4%로, 10년 만에 첫 마이너스 기록이 예상된다. 인허가 지연, 송전망 포화, 원자재 비용 상승 등 복합 요인이 설치 속도를 늦추고 있다. 유럽 태양광산업협회(SolarPower Europe)는 “독일·스페인·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성장 둔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기술 혁신과 시장 제도 개편을 병행한다. 정부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양산화에 향후 5년간 1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기존 실리콘 셀 대비 가볍고, 곡면 적용이 가능해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에 최적화된 차세대 기술이다. 제도 측면에서는 고정가격매입제도(FIT) 비중을 줄이고, 전력 도매가와 연동되는 시장가격 기반 보상 체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수요 기반 프로젝트를 늘리고, 전력 계통과의 실시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설치량은 2029년 92GW, 2034년 104.9GW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 올해 3.25GW 규모의 태양광 입찰 계획을 발표했다. 1차 1GW를 시작으로 5차례 나눠 진행되며, 상업용과 주거용 옥상형, 농업형 태양광을 모두 포함한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3억 달러로 추산되며, 2025~2033년 연평균 성장률 11.2%가 예상된다.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설치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어그리볼타익스)이 확산 중이다. 다만, 중국산 저가 모듈 수입 비중이 99%를 넘어서면서 국내 제조 기반 약화와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 미국의 사례처럼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일본처럼 차세대 기술과 신사업 모델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가격 경쟁을 피해야 한다. 셋째, 중국발 가격 폭락에 대응해 품질·신뢰를 무기로 한 브랜드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 시장이 정책·기술·가격 변수로 요동치는 가운데, 향후 10년은 태양광 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재편하는 ‘골든 타임’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선택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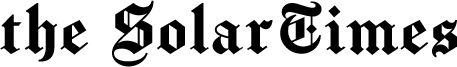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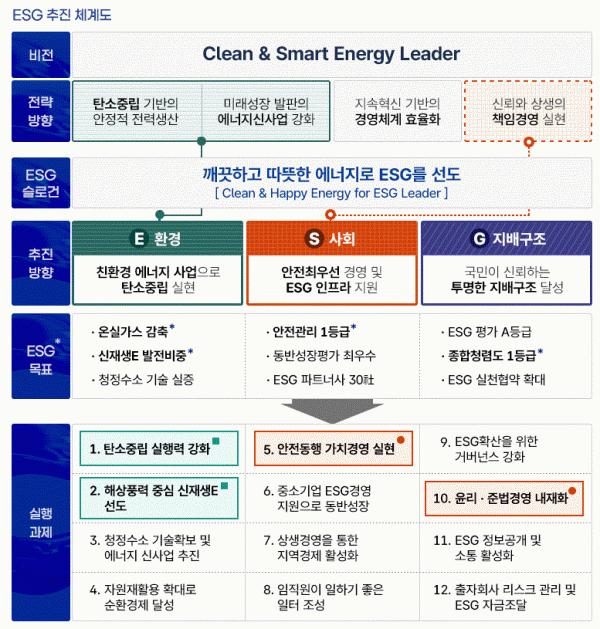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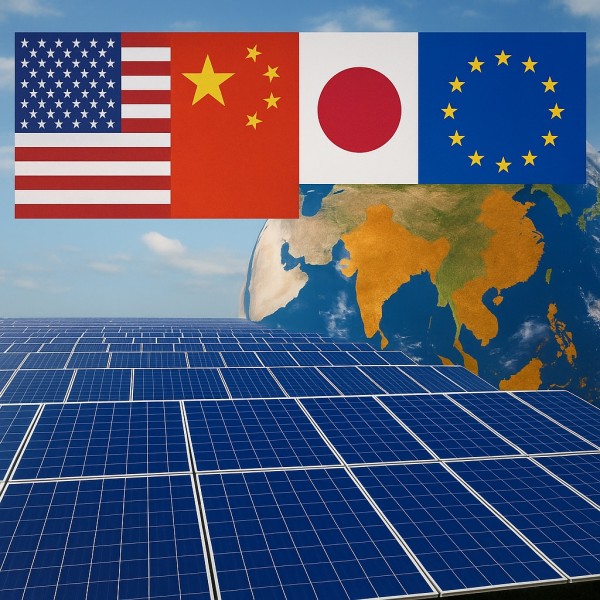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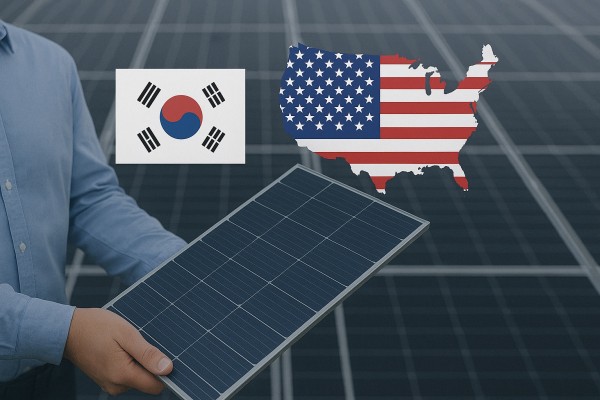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