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루의 시선] 질적 성장 없이는 태양도 버린다

본문
중국 태양광 모듈 가격이 바닥을 뚫고 있다. 1년 사이 60% 이상 떨어졌고, 잉곳(Ingot)·웨이퍼·셀 등 전 공급망이 동반 붕괴 중이다. 더 이상 '중국이 이긴다'는 말도 힘을 잃는다. 이건 단순한 주가 조정이나 업황 사이클이 아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로 보인다.
중국 태양광 기업 50곳 이상이 파산했고 상장사 121곳 중 39곳이 올해 적자를 냈다. 이 수치들이 말하는 건 단순하다. 더 이상 중국 정부도, 시장도, 기술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공급 과잉이다. 78.4GW—전 세계 수요의 두 배 이상을 찍은 생산량은 결국 자국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3,500%가 넘는 관세 폭탄을 날렸다. 바이든 시절부터 미국은 사실상 '중국산 태양광은 오지 마'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보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도 중국 기업은 못 받는다.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진입도 못 하는 시장이 생겨버린 셈이다.
그럼에도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더 싸게, 더 많이 찍어낸다. 그게 유일한 생존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산업의 자해다. 저품질, 저마진, 저수익. 가격 경쟁만 남은 산업은 이미 기술이 아니라 출혈의 게임이 된다. 그리고 그 출혈은 기업부터 쓰러뜨린다.
한국은 이 사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첫째, 수요 기반 생산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처럼 공급 확대에 올인하면 몇 년 안에 수익 모델이 붕괴된다. 무조건 깔고 보는 방식은 이미 시장을 망친다. 한국은 수요자 중심, 시장 예측형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
둘째, 품질과 시스템 경쟁력이다. 단가로는 중국을 못 이긴다. 오히려 태양광을 단순 부품이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시공·O&M·디지털 모니터링까지 통합한 플랫폼 전략이 한국의 생존 방식이다.
셋째, 보호무역 리스크 분산이다. 특정 지역, 특정 고객에 의존하는 수출 모델은 1회 관세 결정에 흔들린다. 한국도 다국적 시장 다변화와 로컬 생산 거점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이 ‘시장 확대’만 외칠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중국은 보조금과 과잉 생산으로 무너졌다. 반면 한국은 품질·투명성·자율 경쟁 기반으로 가야 한다.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성장’의 길 말이다.
중국 태양광 산업의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공급이 수요를 이길 수는 없다. 기술 없는 가격 경쟁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해적 과잉 공급은 태양마저도 버린다.

사진 제공 : AF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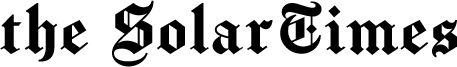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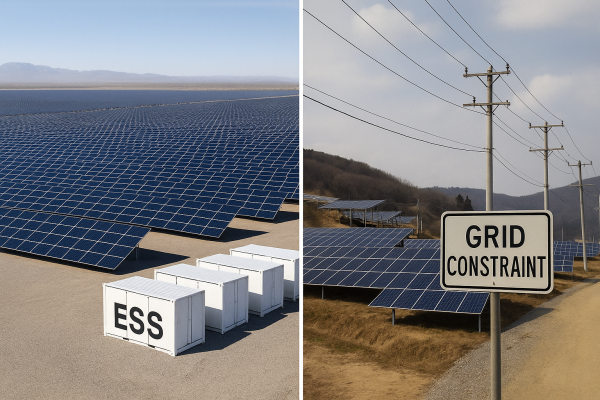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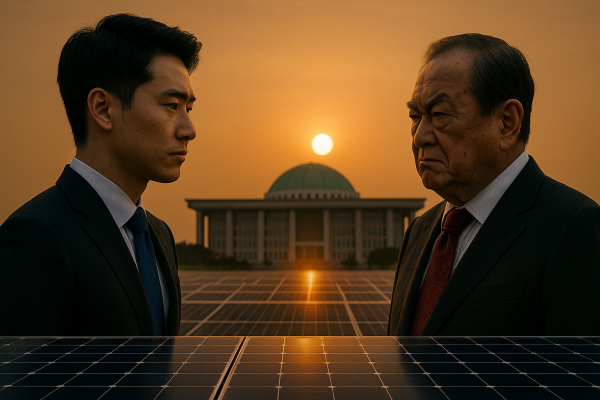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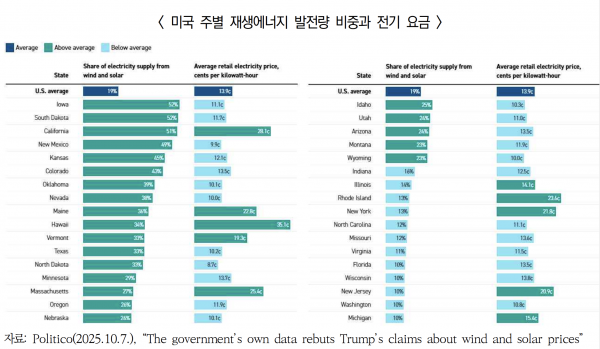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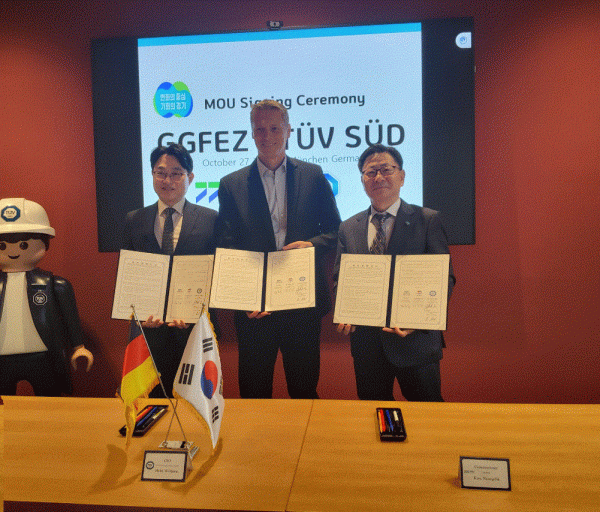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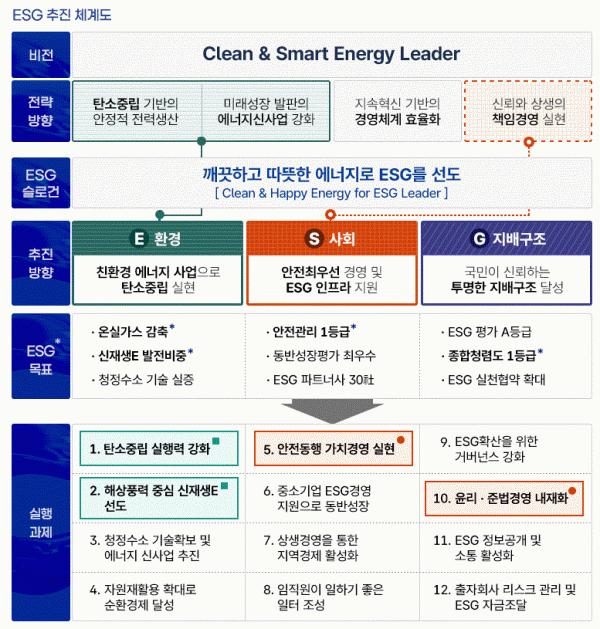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