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루의 시선] 50년 종속 계약...원전 마피아들의 국익을 저버린 배신

본문
체코 원전 수출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국은 50년의 사슬에 묶였다. 특허의 두 배를 넘는 기한, 승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조건, 그리고 부품·연료·시장 포기의 각서. 계약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의원들의 언어는 그것을 “매국”이라 불렀다. 지난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김정호·김한규 의원이 차례로 토해낸 설명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참담한 균열을 드러내는 현장 보고였다.
그들이 짚은 수치는 냉정했다. 원전 한 기당 2,400억 원의 로열티. 웨스팅하우스에서의 의무 구매. 연료 공급 독점. 차세대 SMR조차 웨스팅하우스의 승인 없이는 수출할 수 없는 종속 구조. 여기에 50년이라는 비정상적인 계약 기간이 더해졌다. 특허의 수명을 두 배로 늘려버린 기형적 문구는 기술 발전의 동기를 꺾고 종속의 굴레만을 늘려 놓았다. 이 계약의 본질은 기술 협력이나 시장 진출이 아니라 구조적 예속이었다.
이 조건 속에서 국내 기자재 기업의 주가는 추락했고 투자자의 손실은 번졌다. 반면, 의원들이 지적했듯 웨스팅하우스의 2대 주주 카메코는 계약 직후 65% 주가가 치솟았다. 돈의 향기는 저쪽에서 퍼졌고 손실의 냄새는 이쪽에서 가라앉았다. 한쪽은 웃었고 다른 한쪽은 무너졌다. 수십 년간 축적한 산업 경쟁력이 일순간에 가격표로 환산되는 장면이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김정호 의원은 방송에서 “이사회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대통령실의 지시로 강행됐다”는 정황을 전했다. 김한규 의원은 “원전 마피아가 불가역적 상황을 만들려 한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김원이 의원은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하청 시공사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이들의 언어 속에서 드러난 것은 졸속, 압박, 은폐, 그리고 카르텔이었다. 권력의 그림자가 시장의 논리를 덮었고 그 속에서 책임은 흐려졌다.
비밀 유지 조항은 이 구조의 또 다른 어두운 얼굴이다. 계약서를 공개하면 배상과 파기가 따른다. 그러나 의원들은 오히려 공개가 차라리 낫다고 했다. 국익을 잃은 채 비밀을 붙드는 것보다 빛 아래서 다시 시작하는 편이 더 이성적이라는 것이다. “50년 글로벌 호구”라는 방송 속 문장은 과장이 아니라 자화상처럼 들렸다. 국민의 세금이 담보로 묶이고 국산 기술의 미래는 종속의 도장으로 봉인되었다.
이제 질문은 기술로 번진다. 그간 정부와 업계가 독자 기술을 주장해 왔지만 이번 계약과 합의는 그 허상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솔직해야 한다. 우리는 원천 설계 기술이 없지만 시공과 운영, 공정 관리 능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그렇다면 그 장점을 내세워 협력 모델을 새롭게 짜야 한다. 거짓된 독자 기술의 환상을 지키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의 빈틈을 인정하고 새로운 국제 분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정치적 배경은 더 무겁다. 당시 정부는 체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야 했고 대통령실은 협상팀에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사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묵살됐고 비밀 계약이라는 덮개가 씌워졌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권력의 지시, 카르텔의 이해 관계, 산업의 종속 구조가 교차한 사건이었다. 원전 마피아라는 단어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 남은 것은 책임이다. 계약이 체결된 배경과 과정, 개입한 인물과 조직, 그리고 금전적 이해 관계까지 전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행정 당국의 수사와 입법부 차원의 국정 조사,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계약의 파기와 재협상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책임은 직위가 아니라 행위에 묻혀야 한다. 누가 어떤 이유로 국가 자산을 담보로 삼았는가, 그 행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만일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계약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국가 자산을 담보로 삼은 50년짜리 종속 구조이며 기술의 허상을 가린 채 권력과 이익이 얽히고 설킨 난맥상이다.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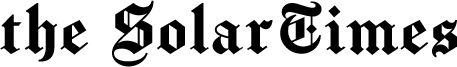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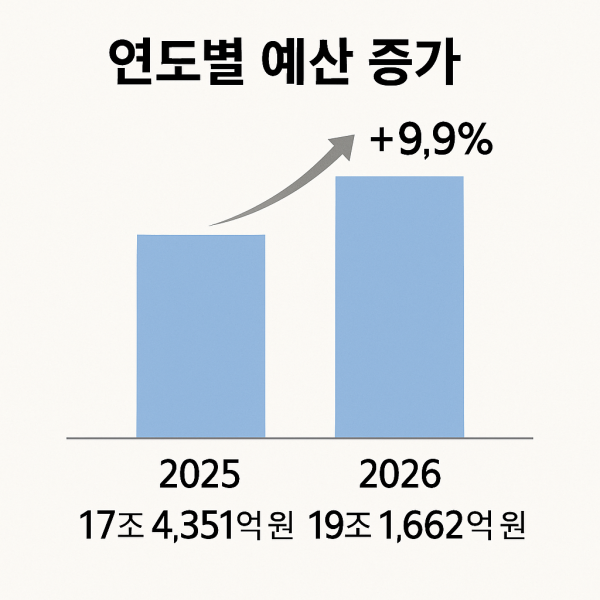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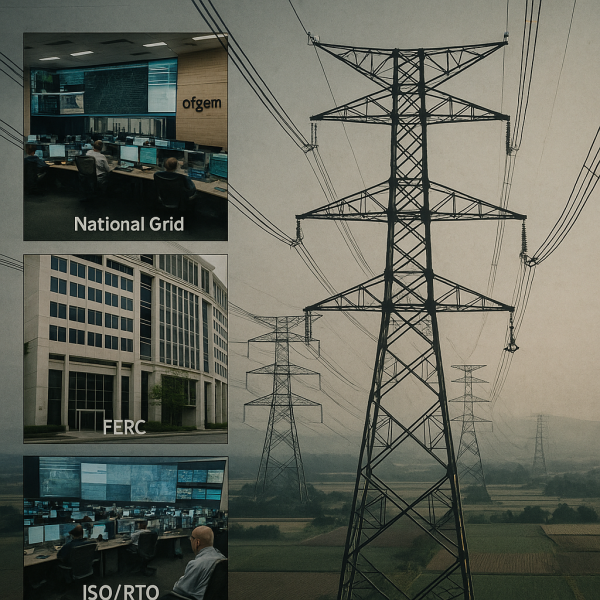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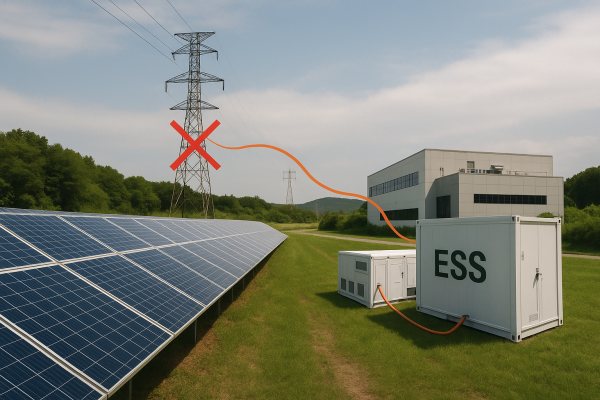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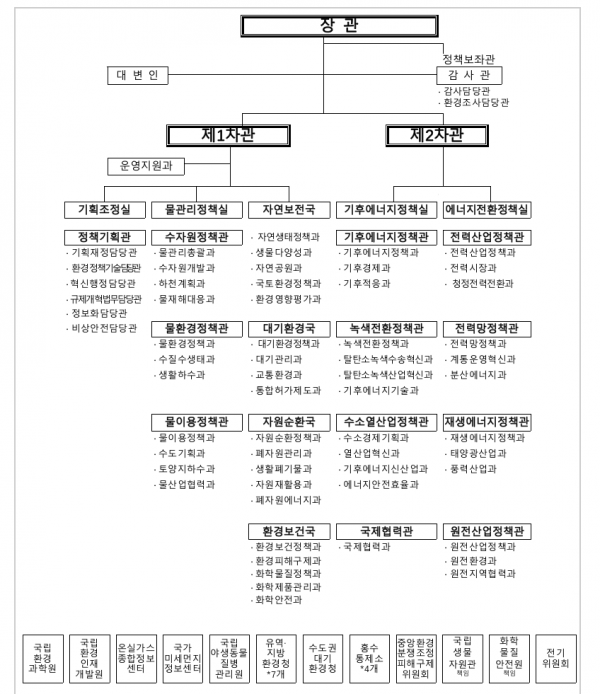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