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루의 시선] LMP 효용성과 선결 과제

본문
전기는 흘러야 하고, 흐르지 못하면 부패한다
서울의 여름은 더 이상 ‘무더위’라고 부를 수 없다. 이것은 폭력이다. 폭염 속에서 돌아가는 에어컨, 냉장 창고, 데이터 서버, 심지어 카페 구석의 노트북까지—모두 전기를 탐욕스럽게 흡수한다. 전기는 무한하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흐름을 필요로 한다. 생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로 보내느냐’다.
전력망. 이 단어는 딱딱하고 관료적이다. 하지만 이 단어는 지금 한국 산업의 미래를 쥐고 있다. 누구는 에너지 고속도로라 부르고, 누구는 숨겨진 병목이라 말한다. 나는 그냥 막힌 혈관이라고 부르고 싶다. 심장이 아무리 세게 뛰어도 동맥이 막히면 손끝은 차가워진다.
정책은 기민해 보인다. 송전망 확충 특별법도 만들었고, 예산도 붙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디가 막혔는지’를 알고 나서 결정된 것인가?
모선별한계가격(LMP: Locational Marginal Price)은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마다 송전망의 혼잡 상황과 발전 단가를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산출되는 전력 가격이다. 송전이 원활한 지역은 LMP가 낮고, 송전이 병목된 지역은 LMP가 높아진다. 이 수치는 단순히 전기 요금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송전선 투자와 산업 분산의 판단 근거가 된다. LMP는 글로벌 전력시장 운영의 표준 도구이지만 한국은 이를 정확히 산출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재국 선임연구관은 “현재 한국은 송전선 부족 여부조차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모선별한계가격(LMP)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정책 실패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망 제어시스템(EMS)은 LMP 산출에 필수적인 ‘안전도제약경제급전(SCED)’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급기야 33일간 잘못된 발전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력이 배분된 사례까지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전기를 퍼붓고 지방엔 비어 있는 전력망이 있다. 요금은 똑같다. 산업은 수도권에만 몰린다. AI 데이터센터도, 반도체 공장도, 결국 서울과 그 인근으로만 간다. 유도할 유인이 없으니 지방은 그저 조용히 말라간다.
송전 혼잡비용이 큰 지역이야말로 투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그 판단은 데이터와 시스템이 제시해야 한다. 혼잡 비용은 더 싼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지 못하고, 비싼 발전기를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어디가 막혔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지표다. 하지만 이 지표는 지금 한국의 전력망 운영 체계 안에서는 산출되지 않는다. 고장이 난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 투자도, 예산도, 정무적 판단도 이 모호함 위에서 이루어진다.
에너지 고속도로라 했다. 하지만 현재의 전력망은 유턴도 못 하는 편도 1차선 비포장 도로다. 어디가 정체인지 알지도 못한 채 우리는 고속도로 출입구를 늘리겠다고 외친다. 미래 산업 육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산업을 지방에 분산시킬 수 있는 전기요금 구조는 건드리지 않는다. 서울과 군산이 같은 전기요금이라면 누가 군산에 공장을 짓겠는가?
모선별한계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혼잡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요금제를 시행하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유치를 유도할 수 있다. 결국 전기의 흐름을 바꾸지 않고는 산업의 흐름도 바꿀 수 없다.
AI가 미래라고 한다. 하지만 AI를 가동할 데이터센터를 어디에 둘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그 전기를 어떻게 실어 나를지조차 모른 채 우리는 그저 ‘성장’이라는 추상에 감탄만 하고 있다. 시스템은 답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질문조차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기는 흐른다. 아니, 흐를 수 있다면. 전기는 미래를 데우고 지방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차등’이 있어야 한다.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내야 한다. 그것이 가격의 언어이고 투자의 우선순위다.
우리는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법은 익숙하다. 하지만 전기를 효율적으로 흘리는 법에는 아직 서툴다. 송전선은 단지 전봇대와 철탑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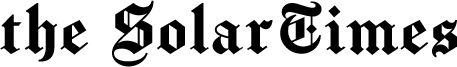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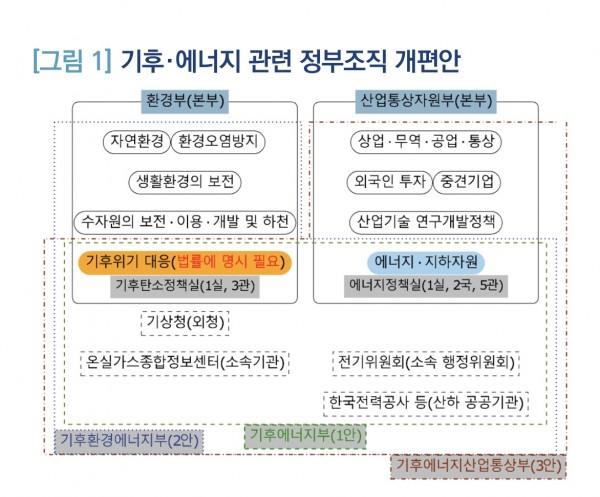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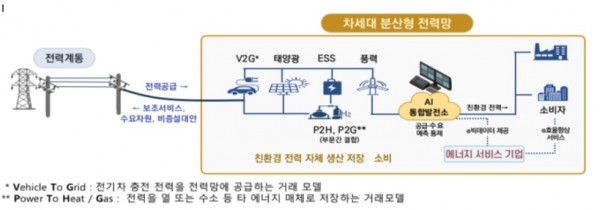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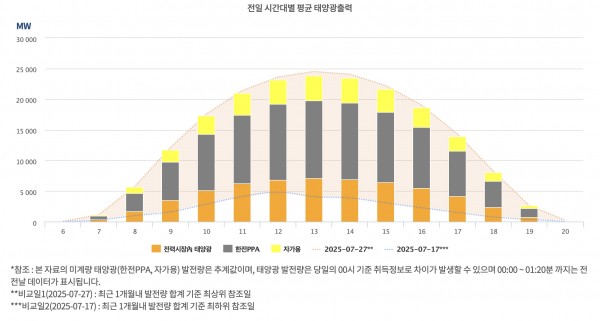


댓글목록0